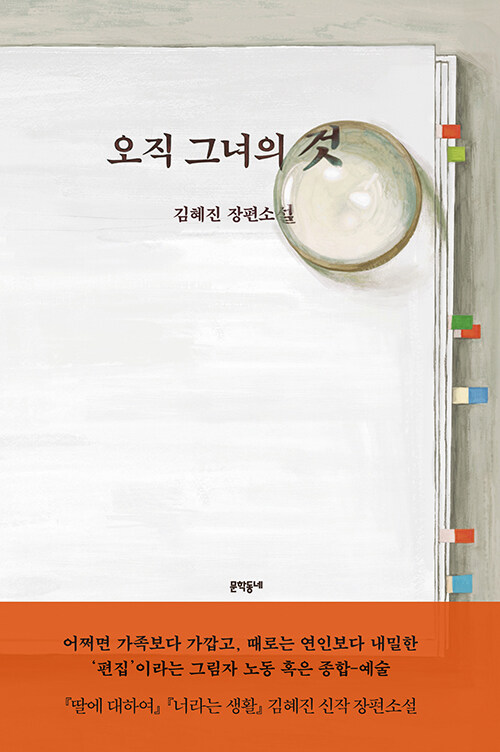출판사에서 인터넷 서점에 올려놓은 책 소개가 다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의 주인공 홍석주는 내성적이긴 하지만 “운명에 순종적인”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책과 글을 사랑하고, 그래서 청강을 받지 않는 소설가의 수업에 청강 허락을 받으러 가고, 부모가 기대하던 안정된 교직 대신 출판사의 교열자가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보다 좋은 책을 만드는 일을 선택하고, 그 결혼으로 인해 여자에게 기대되는 일들 대신 편집자로서의 삶을 택하는 사람이다. 그는 운명에 순종적인 것이 아니라, 평생을 올곧게 책을 사랑하는 인물, 허구의 세계를 종이 위에, 선명하게 인쇄된 형태로 쌓아올리는 인물이다.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더 험난한 길이라도 사랑을 향해 달려가는 인물이 어딜 봐서 순종적인지.
오래도록 그녀에게 열정은 한순간 사람을 사로잡는 무엇이었다. 그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에 변화가 찾아왔다. 열정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일깨우고 유지하는 의지라는 것. 그것이 향하는 곳은 따로 있었다는 것. 그 시절, 석주의 열정은 사람을 단번에 압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만히 길들이는 방식으로 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되고 있었다.
한마디로 “편집자의 일생”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소설은 잔잔하다. 격정적인 감정의 흐름이나 살인이나 폭력, 진득한 로맨스 같은 것은 없다. 그저 손에 들린 교정지의 결을 손끝으로 느끼며 루뻬로 필름을 들여다보는 일의 연속같다. 물론 오탈자가 나거나 대수가 빠진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 모든 일들의 결론은 책을 만드는 삶, 하나로 수렴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파스칼 끼냐르의 “세상의 모든 아침”과도 닮아 보인다. 때로는 안개에 뒤덮일 것 같은 적막한 시골 마을에서, 아내를 잃은 뒤 고독하게 살아가며, 때로는 아내의 영혼과 교감하며 비올라 다 감바의 연주에 몰두하는 생트 콜롱브의 삶과, 고요하게 책을 만들어 쌓아가는 홍석주의 삶은, 어느 한 가지에 평생을 다해 온 사람의 지순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을 것이다.
석주는 그가 그 일에서 어떤 성취를 느꼈는지, 어떤 좌절을 견뎠는지 알지 못했다. 그녀가 아는 거라곤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 앞에 앉아 뭔가를 골똘히 읽던 모습이 전부였다. 어쩌면 그의 삶에서 아주 사소한 일부에 지나지 않았을 무엇.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삶을 이해하는 데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읽으면서 팔토시를 끼고 평생 교열을 보았을, 그리고 교열부가 더는 필요없어진 세상에서 석주에게 블랙윙 연필 여섯 자루를 남기고 고요하게 세상을 떠난 오기서 교열부장을 생각한다. 평생 출판 일을 하다가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나이에 마침내 마지막 책을 내고 출판사를 폐업하면서도 한가해지면 책을 읽어야겠다고 말하는 장민재를 떠올려본다. 주택에 자리잡은 초창기의 산티아고 북스와, 삼 층짜리 사옥으로 이사하고 사장의 딸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산티아고 북스의 풍경을 그려본다. 그리고 홍석주라는 사람을 떠올려 본다. 1990년 무렵 대학생이었고 1990년대 초반에 교열자로 출판사에 입사했던 사람. 아들만 대학을 보내는 게 아니라 형편이 된다면 딸도 대학을 보내는 시절을 지나, 딸이라도 어떻게든 대학에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한다는 인식까지는 도달했으나 여전히 교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받던 그 시대에 20대 초반이었으니, 그는 1970년대를 전후해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아직 교열부가 남아 있고, 출판사가 사세를 확장할 수 있던 시기에 출판사에 들어갔다가, 경제위기와 함께 부서가 축소되고, 다시 작은 출판사에 들어가고, 그 출판사에서 계속 좋은 책을 만드는 일을 생각하며 주간까지 올라간, 지금은 50대 초중반 정도 되었을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아는, 만났던, 같이 일했던 여러 편집자님들의 얼굴이 행간에서 떠오른다. 예전에 2년쯤 일했던 출판사의 대리님이나, 첫 소설을 냈던 이슈 편집부의 차장님, 팀장님, 그리고 짧게는 단편 한 편에서 길게는 책 몇 권 까지, 일을 하면서 뭔가 나에게 하나씩은 남기셨던 여러 편집자님들이. (그분들 연세도 홍석주와 비슷하실 것이다.) 어디보자, 김혜진 작가님도 나와 몇 살 차이가 안 나니, 이분이 데뷔 초기에 만났던 편집자님들도 아마 비슷한 연배가 아니셨을까. 그렇다면 이 소설은 작가님도, 자신에게 이것저것 하나씩을 남겼던, 가능성을 넓혀주었던 편집자님들에 대한 긴 편지같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 책을 10월 18일 팔레스타인 집회 갔다가 사서 돌아오며 읽었는데, 읽다가 환승하면서 폰을 좀 들여다봤더니 누가 “편집이나 교정 같은 잡무 영역”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내가 편집자가 아님에도 굉장히 불쾌했다. 그에 대해 뭐라고 했더니 “잡무”라는 단어 하나에만 버튼 눌렸냐, 본인도 편집자다, 그렇게 말을 하길래 그냥 더 안 싸우고 말았다. 화는 나지만, 그분도 때로는 일이 고단해 막말을 했겠거니.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편집자였겠거니 할 뿐.
나를 소설 뿐 아니라 만화 스토리도 쓸 수 있는 작가로 만든 분도 이슈 편집부의 차장님과 편집장님이었고, 내가 쓰고 있는, 장르가 뒤섞여 있는 무언가를 “그거 SF잖아요.”하고 말하고 알려준 사람도, 이렇게 자료조사를 열심히 하면서 소설을 쓰니 일반인을 위한 교양 인문서도 쓸 수 있으리라며 폭을 넓혀준 사람도. 습관적으로 쓰는 몇몇 단어들에 대해 지적하며 단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든 사람도 편집자님들이었다. 글 쓰기를 아카데믹하게 배우지 못했던 나는 돌려받은 교정지를 보면서 문장 다듬는 요령들을 배웠고, 떄로는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신 분한테 이렇게 문장에 대해 배우는데 내가 이분한테 작가님 소리를 듣는 건 너무 과분한 게 아닌가 생각하기도 했다. 편집자 뿐 아니라. 표지 디자인이나 영업에 대해서도, 솔직히 큰 출판사에는 독립 부서가 있을 만큼 큰 일이지만 작은 출판사들은 외주 디자이너나 영업업체나 총판에 의지한다는 정도밖에 모르지만, 때때로 감탄이 나오게 잘 빠진 표지를 볼 때나, “이번 책은 영업에서 좋아해서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하신 책들이 유난히 잘 나갈 때라든가, 먼 나라의 호텔에서 같은 방에서 묵으셨던 에이전시 대표님이 꿈에서까지 책을 팔고 계신지 영어로 책 소개를 하는 잠꼬대를 하시다가 돌아눕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책이 독자의 손에 닿을 때 까지 누가 있는지 가끔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동안에도, 그렇게 내 가능성을 넓혀준 편집자님들에 대해 요즘은 오프라인으로 뵙는 일은 거의 없이 대부분 메일로 주고받으니까 얼굴까지는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주고받았던 메일들을 중간중간 떠올렸다.
PS) 제목이 “오직 그녀의 것”인데, 편집자들의 성비라든가, 내가 떠올릴 수 있었던 존경스러운 편집자님들도 그렇고, “그녀”라는 말이 낡아가고 있다고 해서 성별 중립적으로 썼다면 오히려 90년대에서 현재까지를 아우르는 여성 편집자들의 노고가 묻힐 것 같았다. 그리고 교정지와 돋보기 문진 형태의 표지가 정말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