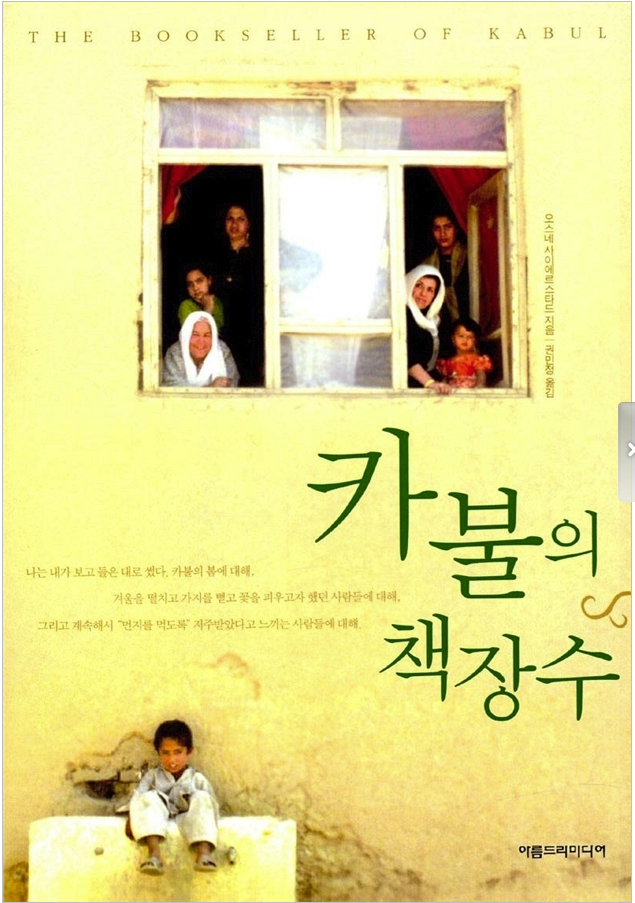왕정,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탈레반 정권의 이슬람 근본주의에 근거한 문화 박해와 지금의 현실을 살아가는 한 가정을 밀착 취재한 글. 물론 저자가 함께 생활한 이 책장수 술탄의 일가는 그리 보편적인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문맹률이 높은 이 집안에서 술탄의 첫째 아내와 여동생은 교사가 될 만한 능력이 있고, 술탄은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 주인이 아니라 금서와 탈레반 서적, 그리고 탈레반에 탄압받지만 언젠가 빛을 볼 날이 있을 옛 왕정 시대의 책들을 분별해서 팔고 찍어낼 만큼의 지성을 갖춘, 문화와 예술에 식견이 있어 문화부 장관과도 안면이 있을 정도의 지성인이자 진보주의자니까. 또한 이 글은 한 가정의 이야기에 중점을 두고 풀어나가다보니 아프가니스탄의 정세나 탈레반, 그리고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 국제적인 문제보다는 진보주의자인 동시에 집에서는 가부장적이고 아내가 나이들자 둘째부인을 들이려 하는 이중성도 보이는 술탄이나, 주위에 비해 부유한 환경에서 살고 있지만 아버지와 아버지가 추구하려는 책의 왕국에 순종해야만 하는 아들들, 그리고 탈레반 정권 하에서 부르카를 쓰지 않고는 외출할 수도 없었고, 직업을 가질 수도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팔려가듯 부모와 오빠들의 뜻에 따라 결혼해야 했던, 탈레반이 물러난 지금도 그 관성 속에서 괴로워하는 여자들의 모습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어차피 탈레반이나 오사마 빈 라덴에 대해 알고 싶다면 관련 서적을 적어도 구립 도서관에서만도 대여섯 권은 찾을 수 있을 것이니, 이렇게 현실적인 일상을 그린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물론 조금 불편했던 것은, 마치 city of joy를 읽을 때 같은 느낌. 패트릭 스웨이지가 분했던 미국인 의사라던가, 혹은 영화에는 여성으로 등장했던, 신부 스테판 코발스키 같은 사람들의 눈으로 인도를 바라보는 듯한 그 시선. 그건 저자의 문제였을까, 역자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읽는 나의 문제였을까. 하여간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 어떤 세계에도 기록문학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종이에 적어놓은 문학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기록한 것 말이다. 레 미제라블에 나오는 파리의 경찰이나 하수구에 대한 설명이 그러하고, 박완서 소설에서 볼 수 있는, 때때로 왜 저런 것 까지 묘사해야 하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그런 것들 말이다. 역사책에 들어가지 않는 일상의 기록, 일상의 묘사. 그런 점에서 이 책 역시 그만큼의 가치는 있을 것이다. 비록 서구의 칼럼니스트의 눈을 빌렸다 하여도, 카불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