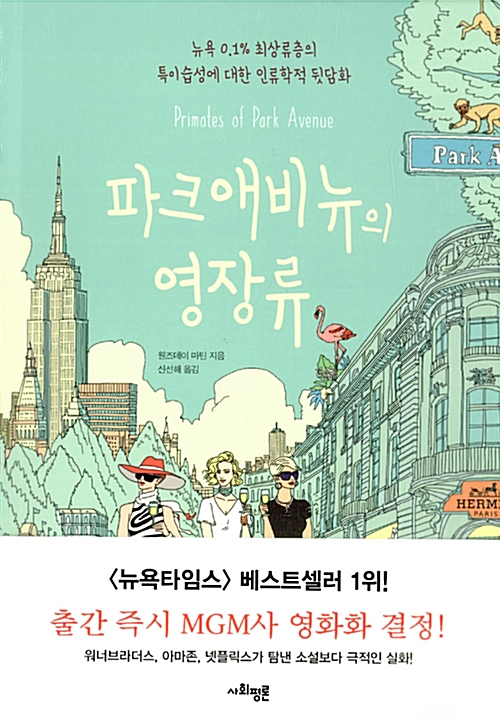그러니까 내가, 작가가 인류학 전공자라는 말에 속았지. 뒷표지에는 “인류학 하는 아줌마”라고 적혀 있다. 뭐랄까, 인류학에 대한 존중도 작가에 대한 존중도 하나도 없어 보여서 사놓고 한참 읽지 않고 집어던져 놓았고, 최근에 읽었다. 역시 작가가 인류학을 전공했다는 건 좀 어폐가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드는게, 아무리 서양인이라고 해도 명색이 자기가 인류학 전공했다는 소리를 한 챕터에 최소 한 번은 할 거라면 게이샤에 대해 그런 식으로 “서구의 환상을 잔뜩 끼얹은 버전으로” 자신있게 말하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인류학에 대해 말하지 않았으면 유쾌하게 읽었을 텐데. 뭔가 인류학을 자기 자신에 대한(그러니까 사모님들의 세계에 뚝 떨어져서 이 세계에 동조되어 살아가기 시작했지만 이건 내가 “골이 비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류학적인 탐구일 뿐이라고!) 변명으로 자꾸 내세우는 것 같아서. 아니, 누구라도 자기가 사는 환경에 따라 변하는 건 당연하고요. 소설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의 주인공처럼 마지막에 그 세계를 떠난 뒤에 “그 환멸나고 가식적이고 천박하고 사치스러운 세계”에 대해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도 짐작하니까, 그 인류학 이야기좀 그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음. 차라리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처럼 그 으리으리한 세계에 당황하고 놀라면서도 동조하였다고 그냥 솔직하게 욕망을 털어놓지 그랬어.
재미있긴 했다. 재벌들 가십도 들으면 재미있는데,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왜 안 재미있겠어. 심지어는 마음에 드는 살 집을 구하는데도 그에 어울리는 차림새가 필요하고, 버킨 백을 구하기 위해 대 모험을 벌이고, “규범의 압박과 완벽을 향한 의욕, 외모지상주의가 유별나고 가혹한 동네”에서 그 규범에 맞추기 위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의 고강도 피트니스를 받아야하고, 몰락한 사람은 그야말로 죽은 사람처럼 잊혀지는 이곳에서 남편이 주는 돈에 의지한 전업주부로 살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강박에 사로잡혀 술과 약에 의지하는 여자들과 그들의 여왕벌 노릇 이야기가 불쾌하면서도 흥미진진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인데, 이 이야기를 흥미본위로 서술해 놓고는 자꾸 인류학이라는 라벨을 붙이려 들 때 마다 갑자기 “누릴 건 다 누려 놓고 내가 원해서 이 모든 일을 한 건 아니라고 발뺌하는”사람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설마 정말 인류학 전공인 게 자랑스러워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는 건 아니겠지. (어딘가의 연재물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고 있는데, 연재물이라면 이렇게 매 챕터마다 인류학 운운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중간에 “어퍼이스트사이드의 맨해튼 게이샤 한 명이 경쟁력 유지에 들이는 비용” 운운하며 외모에 들이는 비용을 정리한 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특히 흥미롭다. 연 5회 커트 및 염색, 매주 드라이, 특별한 날 메이크업 비용, 분기별 보톡스와 필러, 매달 필링, 피부관리, 눈썹과 레이저 시술, 기초화장품과 색조화장품, PT와 영양사, 해독주스, 마사지, 인공 태닝과 성형수술, 피복비 등등을 합쳐서 악 9만 5천달려 정도가 나와 있는데, 이걸 보니 문득 탈코의 기회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기용품으로 물티슈 보온기도 팔더라는 이야기도. 이건 아마 프랑스 육아책 중 한권에서 읽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만든다는 이야기도.(이건 책과 문구에 대해서는 내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그리고 결국 떠오른 건 스텝포드 와이프들이었다. 으악.
앞부분에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 저자 부부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대목이었는데, 매물로 나온 집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이 있었다는 부분이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저자가 인류학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지만, 저자가 너무 많이 했다. 매 챕터마다 했으니까.)
몇몇 아파트는 모델하우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완벽하게 깔끔했지만, 대부분 아니면 상당수가 은근히 혹은 대놓고 방치된 상태였다. 해진 러그와 오래된 카펫 바닥, 낡아빠진 주방, 누렇게 바랜 페인트, 그라고 거의 항상, 먼지를 털거나 은 식기에 광을 내거나 빨래를 개는 가정부가 있었다.
게다가 거실을 둘러볼 때마다 나는 매번 흠칫했다. 집집마다 어김없이 한결같은 사진 액자와 기념품들이 진열돼 있었다. (중략)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집을 파는 것이었다. 그들이 지극정성으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자녀들이 마침내 졸업하여 독립했으므로. 이 부모들은 재정적으로 무리를 하면서까지 가정부를 고용하고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냈다.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느니 이사를 가는 편이 낫기 때문에 이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것이었다. 졸업장과 가정부를 데리고.
이 이야기는 뒷부분의 “완벽한 앞니”에 대한 대목을 읽을 때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명예의 표상에 대해서,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삶”에 대해서. 중간에 “남편의 돈에 의지하는 전업주부들”의 행동은 이렇고 저렇고 나는 비웃었지만 결국 나도 그걸 하고 있었고 운운하는 이야기들, 읽으면서 흥미롭고 끔찍하던 많은 이야기들이 결국은 여기에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