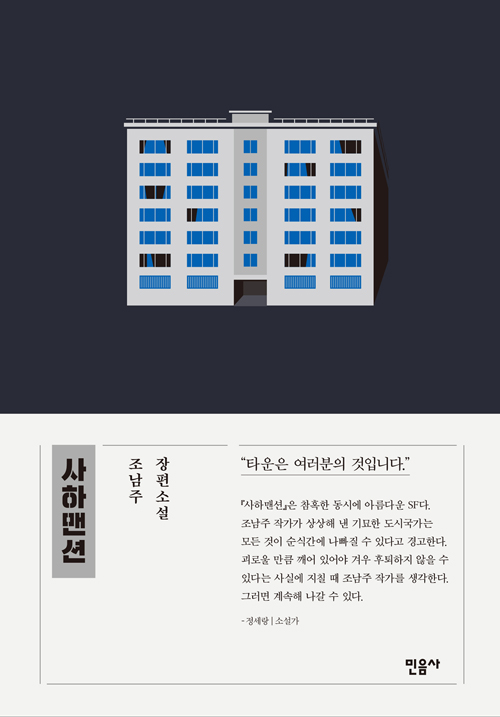읽기 시작하고 곧, 사하맨션이 SF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종이책으로 읽었으면 띠지에 적힌 정세랑 작가의 추천사만 봐도 알았을 텐데. 전자책에는 띠지가 없으니 그런 사전정보는 없었다. 그래서 조금 뜻밖이라고 생각하다가, 작가의 전작을 생각하고 납득했다. 현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세계를 가정하고 시작하는 SF는 사회 문제를 드러내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니까.
그와 별개로 며칠 전 트위터에서 누가 “SF가 탈정치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불만”이라는 식의 글을 읽었는데, SF는 사회 현실을 반영하지 않기 무척 힘든 장르가 아닌가? 하다못해 80년대 라이트노벨이자 당시 대학원생이던 다나카 요시키가 학비 벌려고 쓴 소설이고 스페이스 오페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저 우주를 배경으로 미남군단을 깔아놓은 스페이스 BL(…..)의 향기가 강렬한 저 은하영웅전설만 해도 그렇다. 거기서 자유행성동맹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80년대 아시아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을 반영하고 있다. 하이네센 스타디움에서의 학살 장면을 보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연상하지 않을 수 있나. 탈정치적인 SF를 굳이 찾는다면 웹소설이나 BL쪽의 SF 테이스트가 가미된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게임빙의물, 겜판소 등도 SF고. 그런데 그런 것은 또 싫다면서, 현재 한국에서 페미니즘 테이스트가 들어간 SF들이 나오는 게 그렇게 싫은 걸 보면 그냥 “SF 독자인 나 자신”이 너무 소중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뭐 그렇다.
어쨌든 이 사하맨션은 조금 느슨한 SF다. 말하자면 “타워”같은 느낌이 드는, 기업의 인수합병으로 이루어지고 일곱 명의 총리가 존재하는 도시국가 “타운”을 배경으로(게다가 이 도시국가는 배를 타고 넘어가야 하는 섬이다.) 구룡성채 같은 사하맨션이 존재하는.
이야기는 이곳 사하맨션 주변에서 벌어진 하나의 살인, 자살 혹은 사고사에서 시작하여,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여성 우미의 실종으로 연결된다. 그리고 이 두 사건에, 역시 사하맨션 거주민인 701호에 사는 진경이 있다. 진경의 어머니는 이삿짐센터에서 일하다가 추락하여 죽고, 동생 도경은 어머니가 자살을 해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던 이삿짐센터 사장을 흉기로 찌른 뒤 진경과 함께 사하맨션으로 도망쳤다. 진경은 연인인 수의 강간 살인범으로 몰려 검거되었다는 도경과 실험대상으로 갇혀 있는 우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하맨션 철거 소식을 듣는다. 그리고 진경은 이곳 “타운”의 지도자인 일곱 명의 총리들을 향해, 총리관으로 돌진한다.
정규직 거주민이라 할 수 있는 “주민”과 비정규직 체류민으로 2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L2”, 그리고 거주자격이 없지만 이곳 사하맨션에 불법으로 모여 사는 “사하”들의 계층이 나뉘어 있으며, 타운은 사하를 배척하면서도 사람이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힘들고 지저분한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사하의 거주를 묵인하는 설정은, 기본적으로 SF를 즐기는 독자에게는 다소 식상할 수 있다. 또 몇몇 메타포는 너무 노골적(세월호라든가)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SF의 문법을 가져왔으되, SF에 익숙한 독자가 아닌, 좀 더 보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이너리티의 극한지대에서 도망자, 여성, 노인, 체제에 저항한 사람, 장애인, 고아 등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 작가는 도구로서 이 계급 차별이 제도적으로 정착한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제대로 활용한다.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SF를 많이 읽지 않은 독자에게는 “아, 이런 것도 SF구나.”하고 저변을 넓혀 줄 만 한 소설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텍스트가 영상이나 만화로 만들어질 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일단 장르가 바뀌어도 자기 색을 잃지 않을 선명한 캐릭터다. 캐릭터가 있고, 사건은 굵직한 사건 위주로 굴러가야한다. 굵직한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면 멀티 유즈에 문제가 생기고, 잔가지같은 이야기가 너무 없으면 채워 만들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옴니버스처럼 서로 다른 집 입주민들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사하맨션”을 관통하는 큰 줄기의 사건은 두 가지다. 이 두 사건이 입주민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결말로 모인다. 소설로도 괜찮지만, 이 이야기를 영화로도 보고 싶어졌다. 내가 보다가 “아니 왜 이 부분의 전개가 이렇게 된 거지”라고 생각한 부분들은, 사실 영상화를 하면 은근히 볼만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도 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