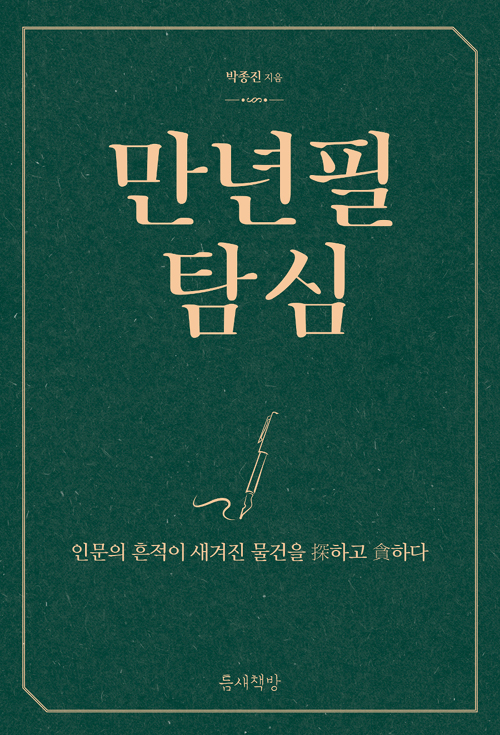나의 첫 만년필은 셰퍼 프리류드 블루였고, 가장 사랑했던 만년필은 지금은 펠리칸 215 트래디션 가로줄무늬였으며, 그 사이 영 맞지 않았던 파카와, 몇 자루의 라미 만년필과, 오로라 한 자루를 썼다. 그리고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세이에게서 세일러 치즈스기 만년필(내가 가진 것 중에서는 아마 제일 비싸지 않나 싶다.)을 선물받았다. 첫 만년필을 사기 전에 검색해 보았던 곳은 유명한 펜후드가 아닌, 오로라 만년필 사용기와 실링왁스 사용기, 그리고 원하는 로고로 실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 꽤 자세히 나와 있던(실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유럽쪽 직구를 할 때 참고했다.) 어느 개인 사이트였고, 몇년이 더 지난 뒤 나는 그 사이트의 주인인 작가와 아는 사이가 되었다는 TMI도 있고.
펜후드의 운영자이자 만년필연구소 소장인 저자가, 자신이 수집하거나 수리했던 만년필, 그리고 역사적인 인물들이 사용했던 만년필에 대해 기록한 이 책을 읽으면서, 문득 개인의 역사들을 떠올렸다. 지금은 이미, 작가가 글을 쓰는 데 주력으로 만년필을 사용하는 시대가 아니다. 부천 만화박물관에 가 보면 전시장 입구에 작가들의 펜과 펜대를 모아놓은 진열대가 있는데, 수많은 펜대들 끝에 천계영 선생님이 사용하신 마우스와 태블릿이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글을 쓰는 작가도 마찬가지다. 만년필이 아니라, 키보드를 생산 도구로 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날로그적인 기록도구를 싫어하는 작가는 별로 보지 못했다. SF 작가연대는 1주년 모임에서 팔로미노 블랙윙 연필을 기념품으로 나눠가졌다. 늘 키보드로 일을 하고, 일정관리도 다이어리 대신 스마트폰으로 다 하는 사람이 만년필을 애틋하게 아끼는 것을 보곤 한다. 이 아름다운, 아날로그적인 물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더는 쓰는 사람이 없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다행히 캘리그래피 붐과 함께, 각종 딥펜이나 만년필에 다양한 펜촉을 꽂아 캘리그래피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 이 책은 그런 감정들을, 애틋하게 사랑스럽지만 머지 않은 미래에 사라지고 말 것 같은 이 물건에 대한 깊은 애정을 담은 책이라서 좋다. 어쩌면 만년필이나 필기도구 자체에 대해, 자료로써 접근하는 데는 더 좋은 책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옆 나라에는 문구덕후가 많다 못해 문구잡지도 나오고 있고, 세일러나 파이로트 같은 만년필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내가 이것을 이만큼이나 좋아한다고 말하는, 그야말로 덕심 가득한 글을 읽는 것은 그 자체로 좋다.
PS) 시간이 맞는다면 만년필연구소에, 잉크를 빨아들이는 부분이 아주 망가지고도 몇 년동안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펠리칸을 들고 가 보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