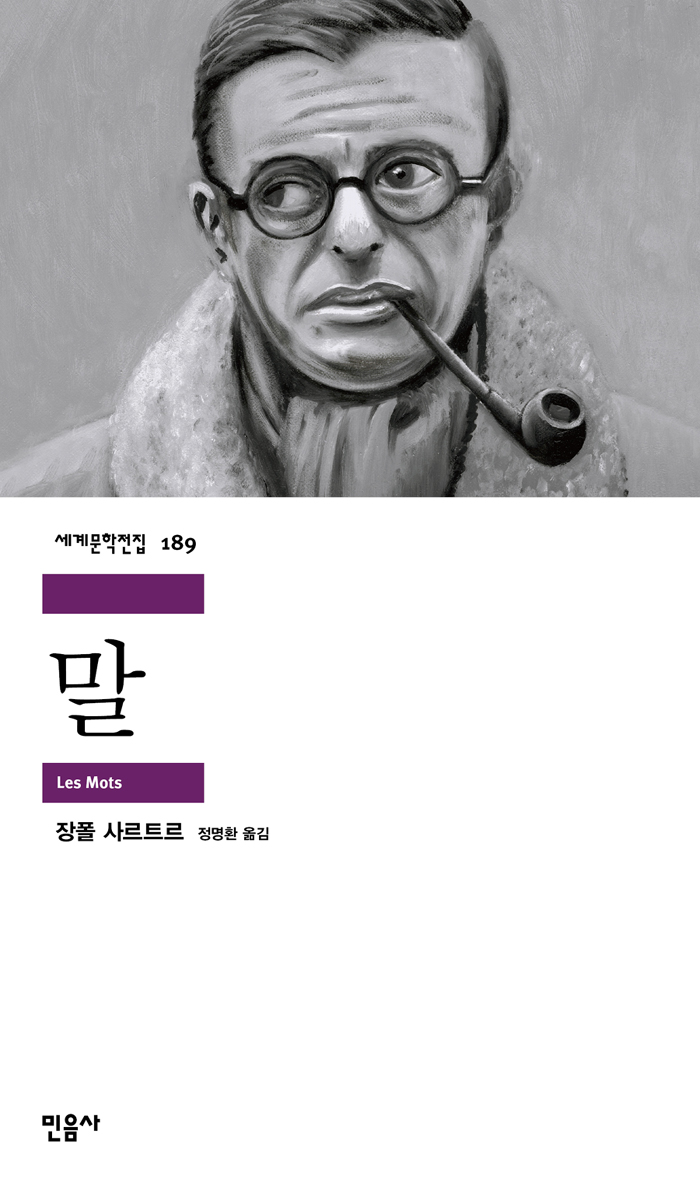민음사 세계문학 100권 읽기. 이 100권을 채우는 여정에서, 맨 마지막, 100번째 책을 어떤 것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했다. 처음에 보바리 부인으로 시작했던 것은 그냥, 그때 도서관에서 마침 그 책을 빌려온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도서관에 줄줄이 꽂힌 책들, 이미 갖고 있는 책들을 죽 들여다보며, 한참을 고르고 생각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사르트르의 말이었다. 말, 타고다니는 말 말고, 언어.
그 후 내가 배우게 된 당대의 신은 내 영혼이 기다리던 신이 아니었다. 내게는 조물주가 필요했는데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준 것은 왕초였다. 양자는 결국 하나이지만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나는 건성으로 바리새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으며 공식적 교리 때문에 나 자신의 신앙을 구하는 것조차 싫어졌다.
사르트르. 보부아르의 연인. 그렇게 간단히 알고 있던 십대 시절. 서로 연인인 지성인들이라는 그 말에서, 연인이라는 다소 낭만적인 말 대신 계약결혼이라는 단어를 밀어넣고, 다시 그들의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은 상태로 어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중얼거리는 얼치기 중고등학생 시절을 지나 사르트르의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대학에 들어와서였다. 나는 사르트르라는 인물 그 자체에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의 글은, 어쩐지 꿉꿉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했다. 젠장. 자의식 과잉 영감같으니. 글은 잘 써 갖고. 그리고 그 자의식 과잉 영감이, 자신의 혈통을, 그리고 어린 시절을 서술한 자서전을, 그래, 자서전이라고 하면 나는 무슨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같이 자신의 성공신화 같은 것을 쓴 것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어린 시절에 집중적으로 할애하는, “밤으로의 긴 여로”의 감상을 적었을 떄 말한 그, 작가라면 누구나 한번은 적었을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일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이제는 어릿광대 짓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아직 무슨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가짜 연기를 하는 것만은 이미 청산했다. 거짓말쟁이가 거짓말을 요리조리 꾸며보면서 마침내 자기의 참모습을 알게 된 셈이다. 나는 글쓰기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글을 쓰기 전에는 거울 놀이밖에는 없었다. 한데 최초의 소설을 쓰자마자 나는 한 어린애가 거울의 궁전 안으로 들어선 것을 알았다. 나는 글을 씀으로써 존재했고 어른들의 세계에서 벗어났다. 나는 오직 글쓰기를 위해서만 존재했으며 나라는 말은 글을 쓰는 나를 의미할 따름이었다. 그런들 어떠랴. 나는 기쁨을 알았다. 공중의 노리개와 같던 어린애가 이제 자기 자신과 사적인 데이트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 방식은 달랐지만 나도 그랬다. 연습장에 이야기를 만들어 끄적거리고, 처음으로 방과 후 컴퓨터 실을 사용할 수 있었던 중학교 1학년 때 내가 디스켓 열 장묶음을 사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다. 리눅스의 vi 에디터에 빨리 익숙해졌던 것도 그것으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그것이 주변에서 이상한 녀석 소리를 듣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하나뿐인 해방구였으니까. 나는 사르트르의 이 미칠듯한 자의식 과잉에 더러 웃기도 하고, 아버지가 젊어서 죽는 바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지만, 그 대신 외가에서 더부살이하며,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외조부의 사랑스런 손주 노릇이나 하면서 보내야 했던 어린 시절에 대해 조금은 딱하다는 생각도 하면서, 이 아이가 책 속의 세계에 몰두하고, 중2병 소리를 듣기에는 아직 이른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내며, 결국은 그것을 글로 쏟아내는 과정을 보았다. 그러한 유년시절, 어찌 보면 마음 속으로 무언가의 뿌리를 내리기에는 빈약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교류도 또래 아이들과의 교류도 부족했던 소년이 성장하여, 이기적이다 싶을 정도로 자유롭게 변화를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며, 생각을 했다. 그 깊이는 다를지언정, 그 깊이의 차이야 한없이 다를지언정 결국 글쓰는 놈들의 어딘가에는 저런 구석이 있게 마련이지. 그것이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쿨함이건 중2병이건 어리광이건 무엇이건 간에.
어제 내가 잘못 행동한 것은 그것이 어제였기 때문이다. 오늘은 또 오늘대로 내일 내가 나 자신에게 가할 준엄한 판결을 예감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의 혼동은 있을 수 없다. 나는 내 과거를 경원하니까. 청년기, 중년기는 물론 막 흘러간 지난해조차도 내게는 항상 앙시엠 레짐이다. (중략) 그렇지만 나는 어떤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그들의 취미나 욕망이나 예전의 계획이나 사라진 축제 따위에 대해서 겸허하고도 끈질긴 애착을 느끼는 것을 보고 좋아하며, 그들을 존경하기도 한다. 그들은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달라지지 않으려 하고, 기억을 간직하려 하고, 처음 안았던 인형과 젖니와 첫사랑을 무덤까지 지니고 가려고 하는데, 나는 그 의지를 대견스럽게 생각한다. 나는 젊은 시절에 욕망을 느꼈다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노파가 된 여인과 만년에 잠자리를 함께 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이들에게 원한을 그대로 품고 잇었고, 20년전에 저지른 사소한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기보다는 차라리 한바탕 싸우겠다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 책을 다 읽고 나는, 이제 사르트르의 글 뿐 아니라 사르트르라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은 매력을 느꼈다. 이렇게까지 자기변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작가의 자의식. 어쩐지 예전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말해주었던, 국어선생님의 은사인 바로 그 마광수 교수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느낌을 중간중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치열하다. 치열하도록, 작가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사람 역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이, I was here를 연상하게 하는 이 장렬한 선언을 바라보며.
오리악에서는 몇 세기 전부터 백색의 폐허가 결정적인 윤곽을, 결정적인 의미를 지닐 것을 바라고 있다. 나는 그것을 진짜 유물로 명명해 놓으리라. 나는 사물의 존재만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다. 언어를 통해서 그것을 꼭 만들어 놓고 말리라. 동시에 나는 언어만을 사랑하는 수사학자이기도 한다. ‘하늘’이라는 푸른 눈 아래로 언어의 대사원을 세우리라. 수천 년의 미래까지 견디는 대사원을 세우리라. 책을 손에 들고 수십 번이나 열고 닫고 해보아도 통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텍스트’라는 불후의 실체 위를 스치는 내 시선은 표면에만 머무는 하찮은 우연에 지나지 않았다. 그것은 텍스트를 어질러 놓을 수도 없고 닳아 없어지게 할 수도 없다. 나는 다만 수동적이며 덧없는 존재다. 나는 등불을 함빡 쬐어 눈이 부신 모기일 따름이다. 나는 서재에서 나오며 불을 껐다. 그러나 어둠 속에 묻힌 책은 여전히 번쩍이는 것이었다.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서. 나도 내 작품이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이런 강렬한 불빛을 지니게 하리라. 그리고 후일 그 작품들은 허물어진 도서관에 간직되어 인간들이 죽은 뒤에도 살아남으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