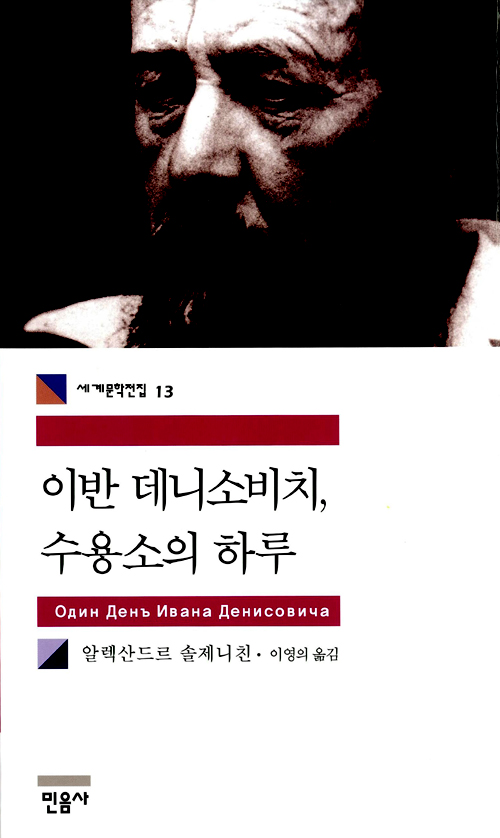이 소설을 처음 읽었던 것은 고등학생 때였다. 고등학교 시절이 감옥과 같았다는 이야기는 언젠가 했던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시절 하면 지옥같았다는 말을 하곤 하니 특별할 것은 없겠지만, 여튼 이 소설을 그 시절에 읽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기회였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이다. (그때 읽었을 때에는 그냥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였다. 설마 감옥, 수용소 이야기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읽었다.)
솔제니친의 이 소설은, 실제로 작가가 경험했던 수용소 생활을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라는 죄수의 하루에 투영한 작품이다. 수용소 생활 8년, 자유를 빼앗기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인생 막장이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궁지에 몰린 죄수의 하루가 흘러간다.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주장이 먹힐 리 없고, 그 와중에도 바깥 세상 뺨치게 다양한 인간군상, 아니, 정확히 말하면 고문관 같은 놈팽이들이 굴러다닌다. 배급을 빼돌리거나, 자기가 의사라는 둥 허풍을 떨거나, 윗선에 비비고 서열을 챙기고 남을 벗겨먹는.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도 없는 현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끔찍하다. 주인공이라고 해서 딱히 고결한 인물도 아니고. 이것은 거의 딱, 바깥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최소한의 염치와 위선조차 찾을 수 없는, 문자 그대로 짐승같이 영락한 상태, 약육강식의 링 위에 올라간 세계에서 생존하는 이야기다. 고통스럽고 비참하며, 읽다가 괜히 시베리아의 한기가 어깨에 느껴지는 이야기. 하지만 결말에서 이반 데니소비치 슈호프의 만족에 대한 이야기는, 쓸쓸하고 가슴을 쥐었다 놓는 것 같다.
슈호프는 완전히 흡족하며 잠에 들었다. 그에게는 그날 많은 요행이 있었다. 그들은 그를 감옥에 집어 넣지 않았고,그들은 그를 단지로 보내지도 않았고 ,그는 점심 때 까샤 한 그릇을 더 훔쳤고,팀장은 작업량 사정을 잘했고, 그는 벽을 쌓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웠고,그는 그 쇠톱날 조각을 몰래 가지고 들어왔고, 그는 저녁에 쎄자리로부터 어떤 것을 벌었고,그는 그 담배도 사왔다. 그리고 그는 병으로 드러눕지도 않았다. 그는 병이 나았던 것이다.
먹구름 한점없는 하루였다. 거의 행복한 하루였다.
빅터 프랭클 박사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지난 봄에 읽었다. 생사가 엇갈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놓지 않고 견뎌내며 살아남은 인간승리담이자, 수용소에 갖힌 이들의 심리에 대한 책으로도 유명하다. 강제수용소에서 인간의 존엄을 부정당하며 오히려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은, 슈호프의 이 하루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희망을 갖는 것, 크리스마스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런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크리스마스가 되면, 혹은 봄이 되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시기가 지나도 여전히 가망이 없을 때) 죄수들이 더 많이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었다.
어떤 면에서, 슈호프가 이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런 식의 희망을 갖지 않았기에, 그저 자신의 생존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 다른 희망을 놓고 체념하고 풀처럼 몸을 낮추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앞서 적과 흑에서도 희망을 놓은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했는데. 경우는 다르지만 니트족들이나, 희망을 놓은 젊은 사람들이 지금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별일없이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희망을 놓아버렸기 때문은 아닐지. 자꾸만 좌절당하는 희망은 오히려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은 아닐지. 이 책을 읽는 내내,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생각하며 섬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