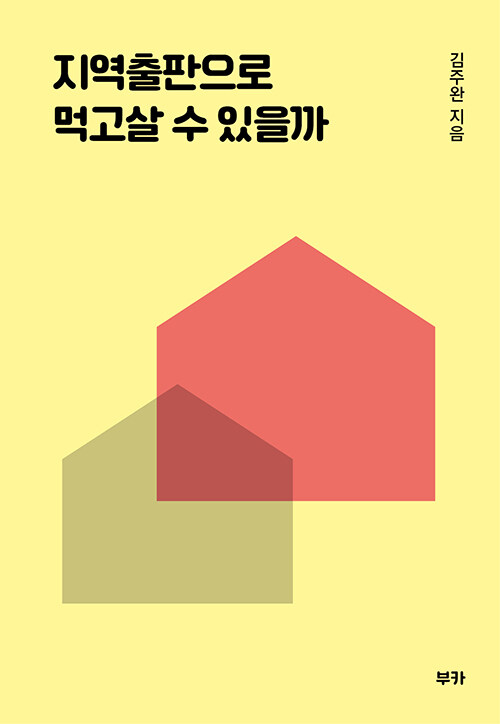내가 가끔 SNS에서 하는 농담중에, 나를 인천 시장으로 뽑아주시면 동인천역 앞에 서문다미님의 만화 END의 주인공 문명인과 유자하 동상을 세우겠다는 게 있다. 서문다미 선생님은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동인활동을(전설의 동아리 “아마란스” 출신이시다) 하셨고 인천에 거주하시며 만화의 현실 배경에도 종종 인천의 풍경들이 묘사된다. 서문다미님 뿐인가. 인천은 미군부대 인근을 중심으로 진작부터 클럽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고, 수많은 만화가와 음악가, 그리고 최초의 PC용 상업 RPG게임을 만든 팀 손노리도 인천 출신인 문화의 도시인데, 그걸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고 늘 생각한다. 내가 인천 시장이 된다면 인천을 서브컬처의 도시, 장르문학의 도시로 브랜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바로 그런 취지의 기획서를 어딘가에 넣어보기도 했다. 과연 누군가가 읽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성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지역의 자산 문화콘텐츠들이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파수꾼 역할을 하는 데가 지역출판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출판사가 내는 지역콘텐츠로 종다양성 확보가 이뤄지고 그게 모이다 보면 한국출판이 건강해지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천은 광역시이지만, 인구와 넓이와 경제규모가 이정도 되면 응당 있어야 할 문화적인 공공장소들이 “서울이 바로 코앞이니까”라는 이유로 미뤄지곤 했다. (그리고 서울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들은 인천으로 실려오고 있지.) 광역시인 인천이 이런 취급을 받을 정도면 다른 지역은 더할 것이다. 모든 것이 서울로 몰리는 이때, 지역출판이나 지역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들은 그래서 소중하다. 인쇄는 을지로에, 디자인이나 출력은 홍대에, 출판사나 출판물류센터는 파주에 모여 있는, 그래서 자기 집에서 책상 하나만 있으면 차릴 수 있다는 출판사를 차리는 일조차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해나가야 수월한 상황에서, 자기 연고지를 중심으로, 큰 출판사에서 내지 않는 책들, 그러나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지역의 소중한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의지를 갖고 그 지역의 구석구석을 살피는 지역출판이나 지역 문화콘텐츠 사업들은 소중하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강원도의 ‘문화통신’, ‘산책’, 경기도의 ‘더페이퍼’, 광주광역시의 ‘심미안/문학들’, 대구광역시의 ‘달구북’, ‘부카’, ‘학이사’, 대전광역시의 ‘모두의책’, ‘월간토마토’, 부산광역시의 ‘산지니’, ‘호밀밭’, 전라북도의 ‘내일을여는책’, ‘책마을해리’, 제주도의 ‘한그루’, 충청북도의 ‘직지’, 그리고 과거 전라북도 완주군에 있었지만 완주군청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공간을 잃은 ‘책공방’의 책들은 우리가 출판사들을 생각할 때 바로 떠오르는 대형 브랜드와는 거리가 많지만 도서전이나 행사에서 종종 그 이름을 찾아볼 수도 있고, 각 지역에 대한 자료들을 찾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되기도 한다. 이 책에는 다뤄지지 않은 다른 지역출판, 지역의 독립출판사들을 생각했고, 그 출판사들이 펴내는 책들이 담고 있는, 그 지역의 문화를 생각한다. 수도권도 아닌 서울로 모든 문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지역의 문화콘텐츠에 더 지원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주목해야 할 텐데.
바로 며칠 전에 트위터에서 누군가가 부산 출신인 자신의 고향 음식으로 차이나타운 인근에서 먹을 수 있었던 콩국에 도넛 이야기를 하자, 중국 음식이 무슨 고향 음식이냐며 중국인에 대한 혐오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부산이나 인천같은 항구에는 예로부터 중국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고, 모여 살며 차이나타운을 이루었고, 그 흔적으로 지금도 부평시장 같은 곳에서는 콩국에 도넛을 먹을 수도 있다. 엄연한 그 지역의 역사들이 사라지고, 문화들이 잊혀지고, 애먼 혐오가 덧씌워지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지자체들이, 또 지역의 문화인들이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 생각했다.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 지점을 계속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