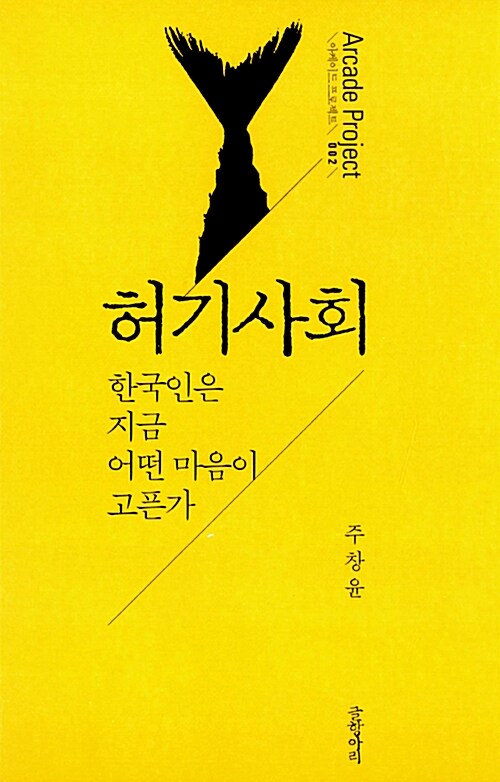이 책이 나온 것은 2013년이고, 2012년 서울여자대학교의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대략,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읽었고, 얼마 전 도서관에서 한번 더 읽었다.
정서는 문화의 패턴을 파악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어느 사회에서나 다양한 문화의 패턴이 존재한다. 그것은 정형화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징 아래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정서적 허기’다. ‘허기’는 말 그대로 하면 배고픔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정서적 허기란 배고픔을 의미하지 않는다. 육체적 배고픔은 욕구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거나 허기진 위장을 채우면 된다. 그러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욕구의 배고픔이 아니라 갈증의 배고픔에 빠져 있다.
아, 그렇지. 강남스타일이 이 책이 나올 무렵 나온 곡이었다. “응답하라” 시리즈도 이때 나왔다. 온갖 오디션 프로그램이 쏟아지던 것이 바로 이 무렵의 일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십년 전의 세계와 지금이, 그렇게까지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웰빙이 아니라 힐링에 목을 매고, 힐링이라면서 문화계가 한입거리도 안 되는 싸구려 위로들을 팔아대던 시절. “응답하라” 시리즈를 비롯하여 “건축학 개론”이나 “써니”, 그룹 세시봉 등 “아직 젊고 아름다웠던 시절의 추억”에 목을 매는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온 것도 이 무렵부터였다. 팬시 인테리어 시장에 가짜 레트로 굿즈들이 쏟아지던 것도. 그 가짜 레트로의 시절에 우리는 풍요로웠던 적이 없다. 추억 속의 1970년대는 사실 유신정권 시절이었고, 1980년대는 군사정권과 맞서는 시위가 이어졌으며, 1990년대의 풍요와 평화는 IMF로 무너졌다. 역사가 탈색되어 버린 “레트로”는 추억을 소환할지는 모르지만, 그 기억은 가짜 기억에 가깝다. 그 기억에 매달리는 퇴행적인 문화들이 언제쯤부터 쏟아졌는지를, 이 책을 읽으며 다시 생각했다.
사냥꾼의 사회에서는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는다.
타진요 카페가 개설된 것이 2010년의 일이다. 욕망으로 인해 타인을 질투하고 원한을 품으며 음해하던 것도, 또 “김여사”같은 말이 나오던 것도, 저자는 정서적 허기의 결과물로 말한다. 한편에서는 희생자를 찾아 사이버 불링을 계속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이입하고 그 주인공에 자신을 동일시한다. 권력의 속물성에 분노하면서도 현재의 사회적 모순을 직시하기보다는, 지금과는 분리된 듯한 과거의 모순을 이야기한다. 여기서 이 책이 나왔던 2013년과 지금 사이에 놓인 커다란 세 가지 흔적을 떠올리게 된다. 하나는 세월호이고, 또 하나는 촛불혁명과 탄핵이며, 또 하나는 페미니즘 리부트다. 이 시대의 징후들은 이미 각자도생과 승자독식이 더욱 심화된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통에의 연대는 사냥꾼의 사회가 아니라 연대를 통해 함께 나아가는 세계를 생각하게 했다. 촛불혁명과 탄핵은 정치적인 승리리라는 효용감과 자신감을 맛보게 했다. 한편에서는 남성 호모소셜이 여성에 대한 성범죄 정보를 공유하고, “나보다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잘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한 질투와 원한과 음해를 계속하고, 여성을 연애와 결혼과 성적인 수단으로 객체화하고 희화화하고 있엇지만, 페미니즘 리부트를 통해 이 불평등과 차별, 혐오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세상은 그리 많이 변하진 않았으며, 여전히 점점 더 무기력하고 각자도생의 길로 걸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걱정하던 미래에는 브레이크가 걸렸다. 퇴행과 나르시시즘과 분노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쩌면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대중은 불편한 폭력의 기억을 통해서 정의를 반성적으로 돌아보기보다 현재의 불의를 잊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십 년 전에 당시의 세상을 바라보던 책을 통해, 십 년이 흐른 지금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인터넷으로 기사를 찾아볼 때 느껴지는 동시성과는 다른, 어떤 시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타임머신의 뚜껑을 열어본 기분이다. 지금, 시사인 같은 데서 20대에 대해 지도를 그리는 작업들도 훗날에는 이렇게 읽히게 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때의 우려들 중 일부는 여전히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며, 간신히 브레이크가 걸린 덕분에 아직 진행형일 뿐,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연대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십 년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다는 것을 확인하자, 앞으로 십 년 뒤의 미래가 걱정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