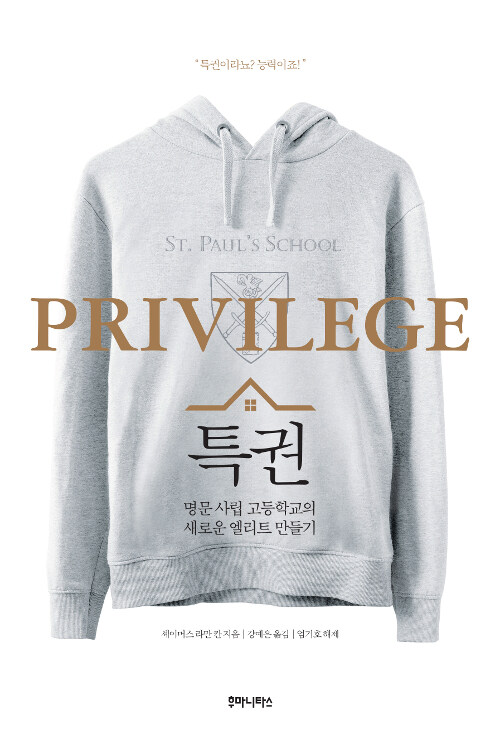셰이머스 라만 칸은 뉴햄프셔 주 콩코드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 세인트폴 스쿨의 학생이었다. 연간 학비는 4만달러에 달하는 이 학교는 백인 부유층의 젊은 “신엘리트”들을 양성하고 있다. 칸은 유색인종 출신으로 아버지는 외과의사로 성공한 파키스탄 이민자였다. 그는 성공적으로 학교생활을 마쳤고 동문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지만, 당시 그는 백인 중심 학교에서 소수였다. 사회학자가 된 그는, 이제 모교의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그리고 보수적인 계급주의를 공고히 하는 신엘리트의 교육문화를 관찰한다. 그들이 어떻게 엘리트의 위치를 획득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 지난 50년동안의 시대 변화에 따라 그들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과거의 귀족들이나 특권층들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자랑이었다. 물려받은 지위와 광대한 영지가 그들의 위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현대의 신엘리트들은 자기 자신을 일하는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신이 노력해서 이룬 것이라고, 누구나 노력하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한다. 몇년 전 SNS에서 한참 돌아다니던 만화 “On a plate”에서 부모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부모의 인맥까지 물려받아 성공한 청년이 스스로의 성공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불평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죠. 무상복지같은 헛소리는 정말 지긋지긋해요. 전 평생 아무것도 거저 받은 적이 없거든요.”같은 소리를 하는 것 처럼. 그들은 노력하고 집중하는 것도 환경의 산물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자신이 노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 자신들이 누리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정”을 빙자하여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걷어찬다. 그리고 이 책은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작은 이너서클 안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모여 있다고 착각하며 자라나는지, 어떻게 자신이 겪은 시련과 자신이 이룬 성과를 과대포장하는지를, 이 학교의 학생이었고 교사인 사람의 눈을 통해 보여준다. 예를 들면 전교생을 다 털어 500명 정도인데 각종 동아리가 100개 이상이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적어도 한 번은 이런 동아리를 이끌거나, 한 분야 이상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판이 짜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 세계적인 인물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를테면 이 학교에서 가장 노래를 잘 부르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이, 교황 앞에서도 노래를 부를 만한 실력자라는 식으로. 이들 신엘리트들은 부모가 가진 것이나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한 것으로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그 경험에는 명문고등학교라는 둥지에서 빚어낸 오만한 착각과 특권 의식이 수반되어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비범함의 신화”의 중심은 백인 남학생들이다. 이들은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어떤 일이든 자신들이 최고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으며,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포장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과거의 엘리트들이 “올바른” 가정교육과 연줄 문화를 중심으로 한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지금의 신엘리트들은 실질적인 특권을 통해 자신들을 개별화된 존재로 만들고, 자신이 누리는 것을 합리화하며, 모든 면에서 자신들을 유리한 위치에 놓은 뒤 그 상태를 “공정”이라고 말한다. 가난하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이들에게 할당을 주어 기계적인 평등이나마 맞춰 보려는 노력을 불공정하다고 치부하며 기회와 자원을 독점하는 것이다.
한편 이 책에서는 같은 신엘리트라도, 여학생에게는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도 지적한다. 자의식을 규제하고 섹슈얼리티를 통제할 수 있는 여학생으로 사는 것과,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이는 엘리트의 특권 표현 사이에서는 종종 모순이 발생한다. 사복을 입는 만찬시간에 남학생들은 거의 옷차림이 정해져 있지만, 여학생에게는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는 것 조차도 너무 어린애같아서, 성숙해 보이는 옷은 너무 노출이 심해서, 단정하지 않아서, 고루해서, 천박해 보여서, 그런 수많은 비난과 자기검열이 수반된다. 여학생에게만 추가되는 이런 구속들은 여학생들에게 몇 배나 높게 나타나는 우울증 발생률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학교를 떠나야 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명문 사립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들은 많다. 사립학교 이야기나 젠틀맨 & 플레이어, 말괄량이 쌍둥이 시리즈, 생각해 보니 해리 포터도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유쾌하거나 흥미롭지만(어둡고 음침한 것들도 있다), 계급과 계층이 있는 세계는 이런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대목들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건가 싶은 사고의 흐름도 보이곤 했다. 문득 해리 포터의 세계에서 마법사가 아닌 머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지금의, 강남 3구에 살면서 서울대에 들어가 우리는 노력했다며 지역균등전형을 비난하거나, 과외 받는 게 얼마나 힘든줄도 모르면서 우리보고 날로 먹는 줄 안다며 갑자기 인터넷에서 광역 저격을 하고 다니는 이들도 생각했다. 분명 어릴때는 기숙학교가 배경인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모습을 살짝 동경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현실에서 자신이 누리는 특권에 저따위로 금칠을 하며 “우리는 노력했다고!!!!! 이게 공정한거야!!!!!” 하면서 자기 본위대로 룰을 바꾸려 드는 모습을 볼 때 마다 저렇게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이 비뚤어진 멍청한 신엘리트들이 장차 어떤 지옥을 만들지 생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