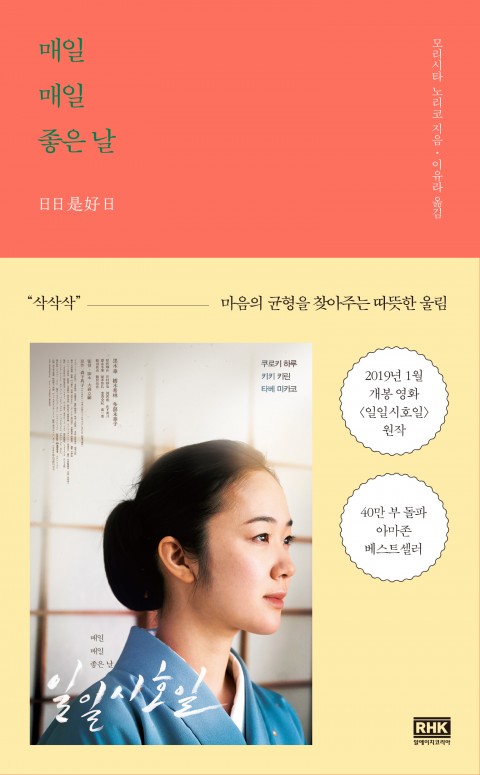일기일회, 이 책에서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정서다. 몇십 번, 몇백 번이나 같은 동작을 반복해도 매번 조금씩 달라지고, 이해가 깊어지고, 변해가는 것. 그래서 그때와 똑같은 순간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것을, 저자는 이십 대 초반부터 계속 배우고 익혀 온 다도를 통해 말하고 있다.
스무 살 때는 다도를 그저 하나의 예법이라고만 생각했다.
계절에 따라, 날씨에 따라, 도구의 조합과 순서가 크고 작게 바뀌는 과정, 계절의 변화와 이십사절기에 따라 가구의 위치를 바꾸거나 족자를 다른 것으로 바꾸어 걸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는 지 알 수 없는 채 그저 다실의 순환 속에서 동작들을 반복한다. 이십 대 초에 계속 해나가기에 지난한 일이다. 하지만 꾸준함이 계속되면 사람은 경지에 오른다.
계절은 차례차례 포개어지듯 다가와서 공백이라는 것이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옛 달력에서는 24절기로 나누어진다. 하지만 내게는 차를 배우러 다니는 매주, 매순간이 각기 다른 계절이었다.
달력으로만 보이던 계절이 냄새와 소리로, 오감에 호소하며 다가옴을 느끼는 순간, 족자에 늘 걸려 있던 문장이 가슴을 치고 지나가는 순간. 그동안 배워 왔던 수많은 동작들이, 결국 하나의 다사를 이뤄가는 과정임을 알게 되는 순간. 조각조각 분절되어 보이던 것의 큰 그림을 마침내 들여다보고 알아보고 깨닫는 순간들이, 무척 섬세한 언어로 그려져 있다.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희미한 소리가 들리는 것 처럼.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 속에서 그저 바깥의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책을 읽게 된다. 폰에 떠 있는 텍스트라는, 지극히 낭만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 책을, 그런 고즈넉한 곳에서 종이책으로 읽고 싶었다. 사각사각거리는 소리가 손끝에서 빚어지는 가운데, 스며들듯이 읽고 싶었다.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사이에 한 방울 한 방울 컵에 물이 차올랐던 것이다. 컵이 가득 찰 때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다 물이 가득 차 표면장력이 높아지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부풀어 오른 수면에 균형을 깨뜨리는 물 한 방울이 떨어진다. 바로 그때 물이 컵 가장자리를 타고 단숨에 흘러내리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했을 때, 뭔가 하나라도 시작해 보자는 마음으로 다도를 시작하던 20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을 그곳에 두고, 자신의 변화를 잔잔하게 깨달아간다. 문득 악기를 배우는 일을 생각했다. 악보도 볼 수 있고, 좋은 소리를 들을 귀도 있는데, 정작 악기는 원하는 대로 소리를 내 주지 않는다. 연습은 지루하고, 어릴 때 처럼 연습하라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다 보면 꾀를 부린다. 나는 그래도 악보도 다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다른 악기도 한참 배웠는데 이쯤이야, 하면서 교만하게 구는 순간들이 시시각각 보인다. 하지만 그래봤자 늘지 않는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꾸준히 연습을 해야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아진다. 그 생각을 했다. 다른 사람이 다도를 통해서 보았던 것들이, 내가 이미 아는 순간들에 닿을 때. 우선 형태를 만들어 두고 그 안에 마음을 담듯이, 우선 지루한 연습곡을 수도없이 되풀이해 보아야 하다못해 동요 한 곡을 연주해도 더 좋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처럼.
“제대로 여기 있으렴.”
“……?”
“일단 가마 앞에 앉으면, 제대로 가마 앞에 있는 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