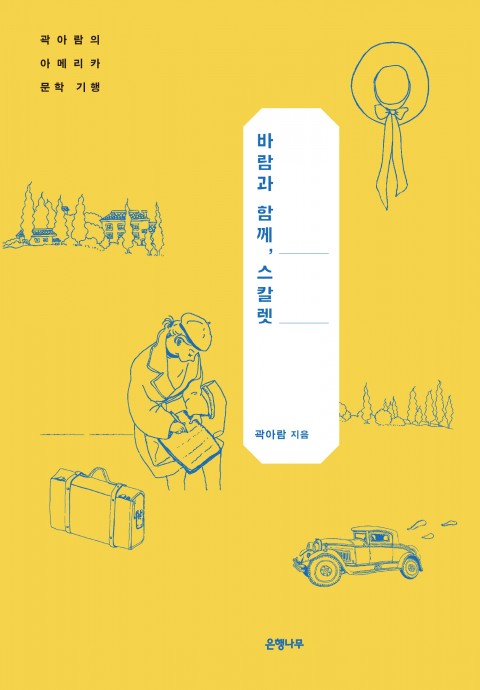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트위터에 올라오던 @2nd_rate 님의 멜라니 해밀턴의 여정 기록을 보다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관련된 책이 뭐가 있을까 검색하다가 걸린 것이었다. 기자 출신의 저자가 어린 시절 읽었던 고전 명작의 배경이 되는 미국의 각지를 따라다니는 이 여행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 된 애틀랜타와 찰스턴, 그리고 조지아 주 존즈버러에서 시작된다.
흥미진진한 대목은 너새니얼 호손의 생가가 있고, “주홍 글씨”나 마녀 사냥을 떠올리게 하는 매사추세츠 주 세일럼 쪽을 방문한 대목. 그 대목을 읽으면서는 여긴 나중에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리, 아주 흥미진진하진 않았다. 나중에 미국을 여행할 기회가 생긴다면 이곳들을 가 보아야겠다고 메모를 해 두거나, 아직 읽지 않은 책을 체크해두긴 하였는데, 이미 읽은 책들에 대한 저자의 의견이 나와는 좀 맞지 않았다고 해야 하나. 특히 “작은 아씨들”과 “톰 소여의 모험”의 캐릭터 해석에 대한 작가의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는 점이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대목 말이다.
어머니의 부유한 친정은 처음에 가난한 딸에게 도움을 주었지만, 자매의 아버지는 그 돈을 몽땅 학교 짓는 데 써버렸다. 보다 못한 친정 부모가 “네 남편은 처자식을 굶기느냐?” 하자, 자기 남편이 모욕당했다는 데 분개한 어머니는 그 이후부터 친정에 일전 한 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 《작은 아씨들》이 미국 페미니즘 문학의 한 갈래로 분류되기도 하는 건 작가의 어머니를 모델로 한 소설 속 네 자매의 어머니가 구현하는 기독교 정신과 모범적인 여성상 덕이기도 한 것 같다.
이것이 여필종부이지 어디가 페미니즘….?
뭐, 백 명이 책을 읽으면 백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법. (하지만 내가 살면서 에이미를 이해할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중간중간, 굉장히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싶은 대목들이 있었다. 마크 트웨인의 고향에서 축제를 한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규모가 작았다는 말을 “강원도 시골 읍내”같았다는 식으로 말한다거나. 또 여행자라고 해서 저래도 되는가, 왜 부끄러움은 읽는 자의 몫인가 싶은 대목들이 군데군데 눈에 걸렸다. “안 위험한 한비야 기행문”같은.
행복한 아이는 좀처럼 책을 읽지 않는다. 홀로 책 읽는 아이들은 대개 외로움과 슬픔이 많은 이들이다. 어린 날 책벌레였던 내게는 현실 세계 이외에 책 속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어진 마음속 세계가 하나 더 있었다.
…어느정도는 맞는 말이지만 중년 이후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단 경계하게 되는 것은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