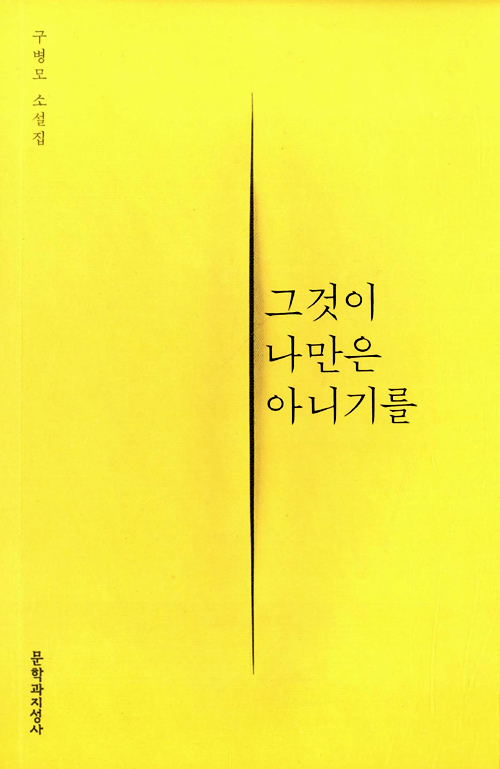읽는 내내 비참해졌다. 애초에 장르가 다르다지만 내가 다루는 세계는 얼마나 비좁은가, 새삼 생각했다. 소독약을 끼얹어 놓은 듯한, 세상에 불만이 많고 당장 생활이 고통스럽지만 기본적으로 자신의 머리를 믿는 인간들이 어떻게든 지금의 자신보다 좀 더 나은 무언가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이야기들은 얼마나 나이브한가. 서늘한 구절들의 틈새에서 문득 그런 생각들을 했다. 괴롭네 어쩌네 해도 어떻게든 필사적으로 다음 단계로의 문을 열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재난같은 세상,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며,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소망하게 되는 이야기는. 그것이 관음증적인 고통의 나열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점이, 읽는 나를 더 부끄럽고 괴롭게 했다. 나는 얼마나 게을렀으며, 또한 얼마나, 내가 쓰면서 내 감정이 무너지지 않을 만한 것들만 쓰고 있었는가. 얼마나 나는 편안함만 밝히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
“여기 말고 저기, 그래 어쩌면 거기”는, 우화등선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한다. 읽으면서, 머릿속에서는 미역의효능 님의 그림으로 컷을 구성해 보고 있었다. 단순하게 수묵화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극단적으로 데포르메된 투시도법의 배경을 조합한 형태로 이 이야기를 보고 싶었다. 꽃과 보석을 토하는 소녀와 개구리를 토하는 소녀가 나오는 “파르마코스” 이야기는, 익숙한 동화와 만약 그 동화속의 상황이 펼쳐졌을 때 벌어질 만한 현실적인 비참들을 볼 수 있었다. 어쩐지 이정애 님이 예전에 나인에 연재하시던 만화들 같은 느낌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다. 텍스트를, 텍스트 그 자체에 몰입하면서 읽은 것은 세 번째, “관통”부터였다. 캔버스 위에 칼로 그어 놓은 듯한 현대미술과, 그림 속의 도원경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결합되어 있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평범하고 고통스러운, 어떻게든 더 낫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가족과 남자에게 발목이 잡히고 만 가난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이 미술을 전공한 것에 대해 공부를 안/못한 남동생이 생색을 낸 것도, 그런 자신에게 온 가족이 투자도 하지 않고 기대한 것도, 임신을 했지만 연인이 중절수술 비용을 내는 대신 아이를 낳고 살자고 하는 것도, 그 결과는 돈 못 벌어오는 남편과 미친 시누이, 독박육아, 게다가 가난한 친정에 남편이 손을 벌려대는 것이었다는 진실도. 여기에 8개월 된 아기에게 이유식을 시작할 돈이 없는 가난이 나오자(4-6개월 이후에는 이유식을 시작해야 하고, 양질의 단백질을 먹여야 함) 신생아를 안고 나직하게 소리내어 소설을 읽어주던 나는 뭔가 더 말을 할 수 없는 기분이 되고 말았다. 있을 법한 재난과 현실적인 고통들, 찜찜하고 초현실적인 도피 혹은 파국. 읽는 내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종류의 고통과 내가 알지만 아슬아슬하게 도망치고 만 고통들을 생각했다. 이 책의 제목 그대로 그것이 나와 내 가족, 내 지인들이 겪을 고통과 파국이 아니기를 내심 바라게 되다가, 문득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쓸 수 있는가를 계속 집요하게 떠올리게 된다.
“관통”과 “어디까지를 묻다”가 특히 괴로웠다. 그저 살아가고 견뎌내야 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 을이 을을 괴롭히는 세상에서 젊은 여자의 위치에 대해, 가족조차 가해자가 되는 관계들에 대해 계속 생각한다. “식우”는 “28일”이나 “감기”같은, 특정 도시를 배경으로 한 질병재난물의 비틀린 버전일 것이다. “덩굴손증후군의 내력”은 세월호와 관련이 있을까 문득 생각했는데,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그 느낌을 받았는지는 잘 생각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