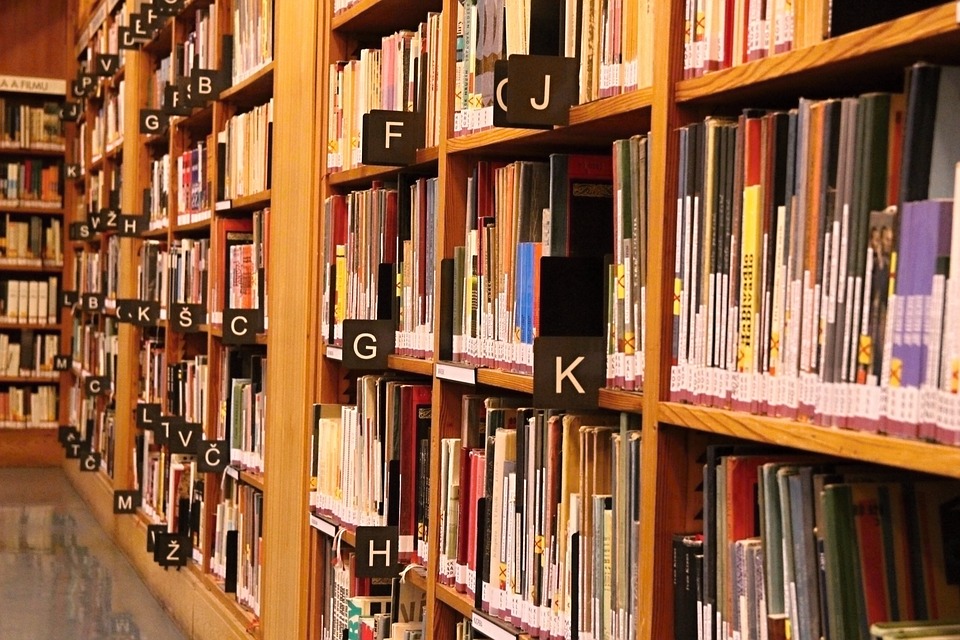- 91쪽. “야담은 사료의 측면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은 역사이지만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존재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공통된 감정구조에 호소하는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속성은 역사가 국사로, 과거의 모든 사실이 민족적·지리적 경계 안에서만 다뤄지는 우리의 현실 상황에서 보다 본질적인 역사의식을 담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고정화된 의미 속에서 죽은 사료와 대화하지 않고, 역사화되는 현재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과거에 비추어 이해하는 능동적인 성찰행위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윤석진, 「2000년대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장르 변화 양상 고찰 1」, 『한국극예술연구』, 제38집, 한국극예술학회, 2012, 304면 참조
(“조선왕조 오백년”등 정사 사극이 나오기 전 1970년대 사극이 야담을 반영한 것을 언급하며) - 96~97쪽 “하지만 공포·액션·코믹·멜로·수사 등의 장르적 이야기를 풀어냄에 있어서 과거라는 배경이 필연적으로 요구되었다면 야담이 지니는 본래의 현실 반영적 속성이 구현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같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20세기 현재에서 벌어지느냐, 아니면 15세기 조선에서 벌어지느냐에 따라 주제와 텍스트의 의의는 달라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중략)
“오히려 방송 초기부터 역사 드라마의 중심에 놓여있었던 야담은 1980년대 들어 주변 담론으로 밀려나는 와중에도 나름의 영역을 확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과거를 선택하고 서술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현실을 은유하는 거울로서의 과거라는 역사적 상상력 하에서 텍스트적 가치로서의 의미만을 지닐 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야담이 어떤 이야기로 재탄생되든 그것이 우리의 기억과 향수를 자극하는 이상, 역사의 어느 지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21세기 현재와 필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는 시대적 차이, 그럼에도 최소한으로나마 공유되는 기억으로부터 이후에 야담이 역사드라마에 재위치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105쪽 “야담은 역사적 사실과 무관한 상상의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과거를 현재를 은유하는 공간으로서, 극적 사건을 주체의 성찰을 이끄는 재해석된 이야기로서 만드는 것이다.”
- 105쪽 “수많은 야담 중에서 ‘구미호’ 서사와 ‘처녀귀신’ 서사가 끊임없이 재해석되는 것은 그것들이 2000년대 역사드라마에 적합한 성찰적 속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구미호는 전국 곳곳에 존재하던 설화가 TV 드라마에 의해 재정리된 경우이고, 처녀귀신은 우리 기억 속에서 가장 오래된 비인간적 존재 중 하나다. 그만큼 구미호와 처녀귀신 서사는 역사드라마에서 가장 빈번하게 채택된 야담이었는데, 이는 두 이야기에 사회의 모순을 성찰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 106쪽. “‘처녀귀신’은 인간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 한풀이를 꿈꾸는 존재다. 구미호 서사와 달리 여기서는 처녀귀신의 한풀이가 반드시 이뤄진다. 역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세 번째 단계(세 번째 부임한 사또, 세 번째 증거의 확보)에서 처녀귀신은 한풀이에 성공한다. 처녀귀신이 죽음을 당하는 이유는 돈과 성욕이 대표적이지만 살해자의 삿된 욕망이 빚은 참극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때 희생자인 처녀는 욕망에 때묻지 않은 순수성을 상징하며, 그의 죽음은 타자화된 존재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처녀귀신 서사에서 중요한 것은 한풀이가 이루어져 인간다움이 회복된다는 점, 그리고 그 한풀이가 반드시 사또라는 공권력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이다.”
- 106쪽 “‘구미호’는 인간이 아닌 존재이지만 인간이 되고픈 욕망을 지닌 존재다. 그러나 구미호 서사에서 구미호는 인간이 되는 데에 반드시 실패한다. 지역적 특색과 각색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마지막 단계(100번째 간을 먹지 못하거나, 100일 또는 10년째 되는 날에 정체가 드러남)에서 구미호의 인간되기는 실패한다. 구미호의 실패는 대부분 남편, 혹은 마을 사람들로 인해 발생한다. 이들은 가부장제 사회의 경직성을 상징하는 존재로 외부인이 공동체에 편입되는 것을 거부한다. 즉 구미호 서사는 인간보다 더 인간적은 존재의 좌절을 통해 인간과 사회의 치부를 드러낸다.”
- 107쪽 “구미호 서사는 가부장제라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처녀귀신 서사는 권력구조라는 보다 보편적인 모습으로써 사회의 모순을 폭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인간이 아닌 존재의 사적인 이야기이지만, 사회에 의해 희생된 개인의 인간다움에 대한 이야기라는 보다 이데올로기적인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 107쪽 “구미호 서사가 가부장제의 모순을 들춰내는 데에 치중하는 고발의 서사라면, 처녀귀신 서사는 모순을 드러내고 봉합하면서 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순응의 성격을 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구미호 서사는 구미호를 주인공으로 두고 어떻게 인간되기에 실패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인간적인 구미호와 비인간적인 인간의 대비를 통해 인간다움을 묻는다. 반면 처녀귀신 서사에서 주동인물은 사또이고, 그가 어떻게 처녀귀신의 한을 풀어주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억울하게 죽은 인간의 인간다움 회복과 공권력의 정당함을 동시에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