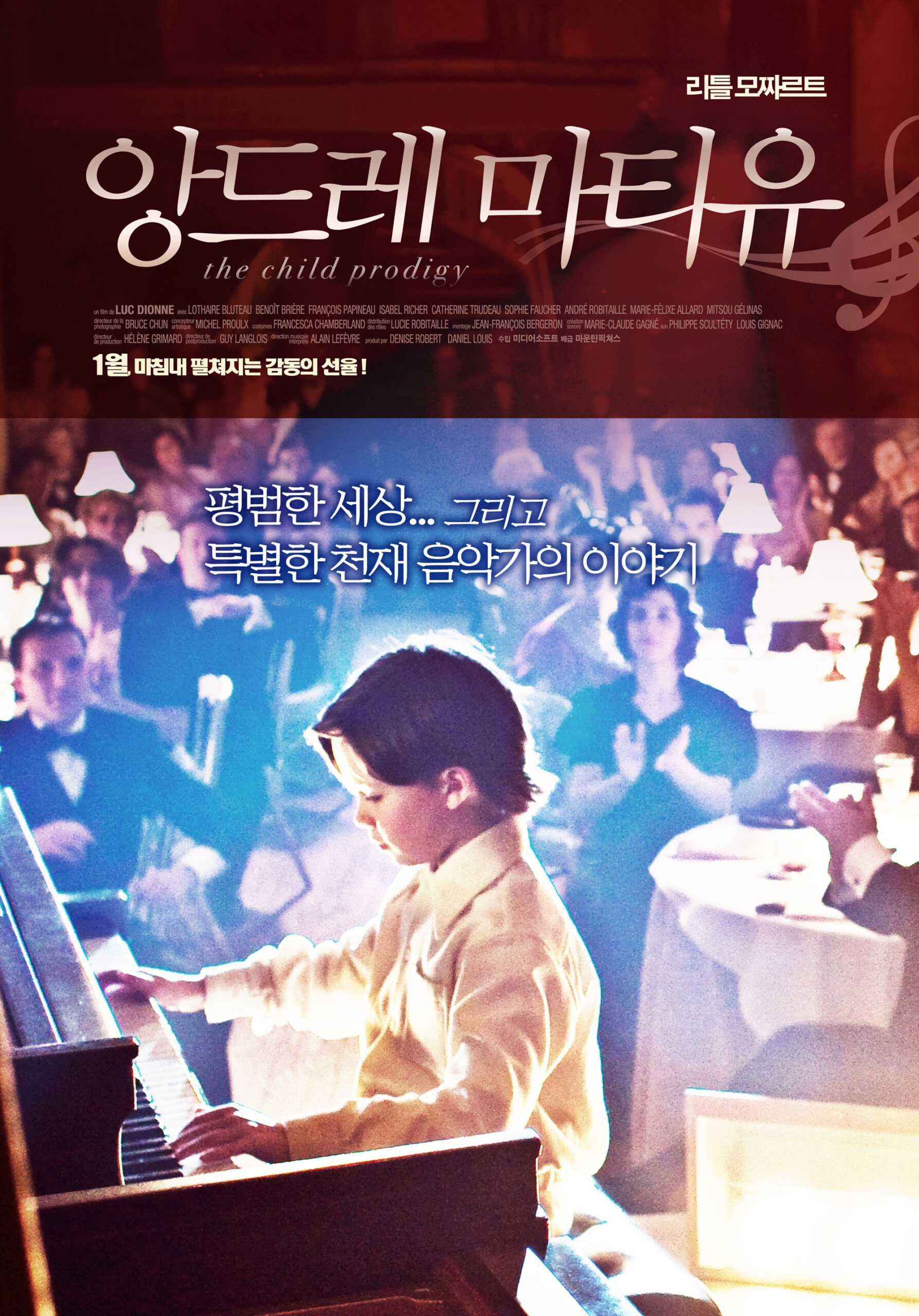영화를 보는 내내, 뻔뻔한 모친의 얼굴을 보며 화가 치밀었다. 조디 피콜트의 쌍둥이 별을 읽을 때 이상으로 불쾌한 여자였지만, 현실에도 저런 여자는 쌔고 널렸지.
음악교수인 로돌프 마티유가, 어린 아들 앙드레의 음악적인 재능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을 가게 하는 것 까지는 좋다. 굳이 미국으로 건너와 줄리어드 음대 교수들 앞에서 재능을 펼쳐 보였을 때, 교수들이 앙드레에게 장학금을 주어 연주와 작곡을 가르치려 하자 그 모친은 온 가족의 생계를 모두 책임져 줄 것을 요구하고, 그 뻔뻔한 요구가 기각되자 앙드레를 데리고 나와, 그저 리틀 모차르트 소리를 들으며 런던, 파리 등에 순회 연주를 하게 한다. 아들에게 집착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 뽑아내려 하는 치맛바람 센 강남엄마?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건 엄마가 아니라 거의 기생충급. 남편을 대신하여, 전세계적인 스타 연주자로 부와 명예를 가져올 지 모르는 아들에 집착하며 그에게 온 집안의 생계를 떠맡기는 어머니 때문에 앙드레도, 소외되어버린 동생도 정상적인 유년기를 보내지 못한다. 다만, 라흐마니노프의 제자인, 지금은 아코디언이나 주크박스를 연주하는 아저씨 덕분에 조금은 숨통을 트고 살 수 있었던 그는, 자라 어른이 되며 모친과 반목하고, 천부적인 피아니스트라는 칭찬만으로는 더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음악적인 재능을 작곡과 즉흥곡으로 풀어내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에게 피아니스트로의 재능만을 요구할 뿐이다. 고전적인 클래식 음악은 이미 라흐마니노프를 마지막으로 한물 갔고, 새로운 음악들이 몰려오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클래식의 덕목은 고전의 반복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반발하며, 술을 마시고, 자살을 기도하고, 멋대로 결혼하며 앙드레는 몰락해간다. 그래도 그에게 연주회나 작곡 기회를 알선해주려 발벗도 뛰어다니던 어머니는, 겨우 그를 위해 기회를 얻어오지만, 그 기회는 윗선의 변덕으로 사라지고, 앙드레는 절망한다. 영화는 어린 천재였던 앙드레가 서른 아홉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까지의, 절정에 있다가 몰락하는 과정을 천천히, 그러나 진득하고 리얼하게 그려낸다.
영화 자체는, 좋았다. 지루해하는 사람들도 꽤 보였지만,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주는 그늘에 대해 눈을 뜨고 똑똑히 보란 말이다, 하고 소리쳐주고 싶었던 영화. 한 사람이 몰락했다가도 다시 성공하는, 소위 “베토벤은 청력을 잃고 절망하여 자살하려 했지만 결국 환희의 찬가 같은 것을 썼다.”는 식의 이야기나, 아니면 한 사람이 서서히 절정에 올랐다가 갑자기 몰락하는 과정 같은 쪽을 보기를 원하는 관객에게, 계속 일관적으로 한 사람의 파멸과 몰락 과정을 그린 영화가 재미있을 리는 없겠지만,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기승전결 클라이막스까지 다 갖춰가며 살아지는 것은 아니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