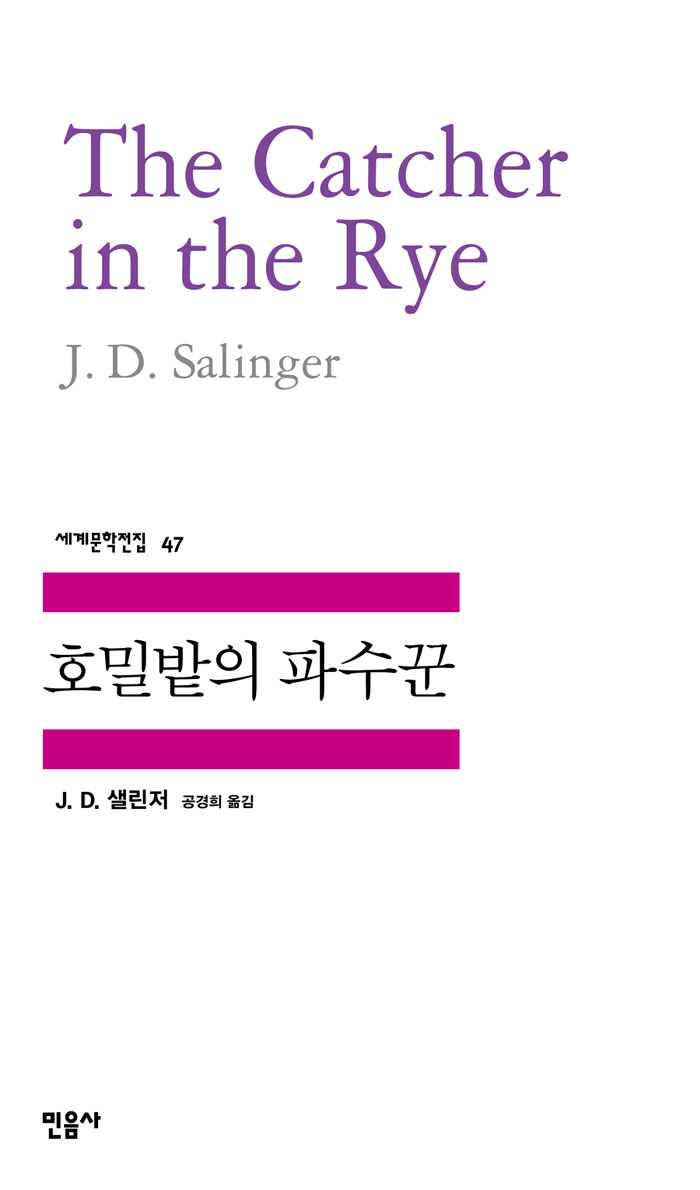이 책은 괴상한 번역 때문에 한동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전설의 발번역 “귀두”의 출전이 바로 이 책이다. (“머리를 쓰다듬었다”는 대목을 이 책에서만 “귀두를 쓰다듬었다”고 번역했다.) 사실 그 부분만 문제인 것은 아니어서, 1인칭 시제인데 나오는 어미의 한 8할이 “~것이다.”로 끝나서 읽는 내내 무척 어색한 기분이 들기도 했다. 그동안 이 책의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책들을 꽤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어쩌다가 이런 참사가 난 거지. 그런데다 표지도, 민음사 세계문학 다른 표지들에 비하면 이상할 정도로 성의가 없다. 이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호밀밭의 파수꾼은, 이 목가적인 제목과는 상관없이 네 번째로 옮긴 학교, 명문 펜시 고등학교에서 막 퇴학당한 소년 홀든 콜필드의, 사흘간의 뉴욕 방황기이자 청춘 잔혹사다. 전사의 후예도 컴백홈도 아닌, 그야말로 찌질하고 불평만 많은 데다 어른들은 더럽고 학교는 가식적인 놈들만 득실거리며 뭐 그런, 잘난 것 하나 없는 놈이 자의식만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야기. 공부건 싸움이건 연애건 무엇 하나 잘 하는 것 없는 놈이 이정도로 자의식 강한 것도 재주는 재주지만. 이 책을 십대 후반, 정확히는 수능 끝나고 아니면 대학 1학년 초반에 읽긴 읽었다. 그야말로 방황이 절정을 찍고, 이제 눈에 드러나는 반항은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이것저것이 치열하게 끓어오르던 시기였다. 그때의 나도 어지간히 불만 많은 인간이긴 했지만, 곱게 자란 도련님 주제에 이정도로 찌질거리는 놈팽이를 보고 있으려니 아주 짜증이 돋았다. 대략 밀란 쿤데라의 불멸과 더불어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책으로 손꼽을 정도였으니. 인간이 이래도 되나, 치열함도 무엇도 없고. 적어도 싸움이라도 죽기살기로 해서 상대를 두들겨 패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다. 무엇 하나 시도도 도전도 하지 못한, 그냥 곱게 자란 중2병 도련님의 어리광 같은 것. 결국은 동생을 붙들고 하소연하는 부분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으며, 뭐라고 떠들어대어도 결국 자기도 센트럴파크의 오리들이나 다를 것 없는, 날지도 못하고 겨울이 되면 누군가 돌봐주어야 할, 그런 중생 그런 청춘에 지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오리들 이야기가 세번째 나올 무렵에는 그냥 멋진 징조들에서 아지라파엘과 크롤리가 오리에게 빵조각 던져주는 부분을 떠올리며, 한숨 한 번 더)
십대 때 해봤을 법한 생각이다. 나 역시 했던 생각이고. 고3을 찍고 읽을 게 아니라 한 3년만 먼저 읽었어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을 것이다. 그 중2병 정서 말이다. 세상은 더럽고, 지켜야 할 가치는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을 지키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를 구원하는 것은 오히려 죽은 동생 앨리와 상냥한 여동생 피비다. 그가 그런 순수한 마음을 이런 낭떠러지같고 위선 가득한 세상에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대화를 보다 보면 피비가 훨씬 더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며, 미묘하게 쓴웃음이 나는 대목이 생겼다. 홀든이 헐리우드에서 극작가로 활동하는 자신의 형, D.B를 “까는”. 그렇다, 비난도 아니고 이건 그냥 “까는”거다. 여튼 그렇게 까고 있는 대목이다. 재능을 돈과 맞바꾸는 더러운 어른이라는 듯 D.B를 비난하는 홀든을 보며, 영화를 싫어한다고 경멸조로 말하는 그를 보며, 불행히도 나는, 내 여동생을 떠올렸다. 내 여동생은 피비같은 아이가 아니라, 미안한 말이지만 자기 언니가 소설 쓴다고 하니까 그쪽 장르는 다 쓸어서 무시할 정도로 대단한 성격이어서 말이지. 글쎄, 내가 그따위 잡소설 쓰는게 쪽팔리다고 소설따위 안쓴다고 하던 내 여동생은, 지금은 좀 그 마음이 변했으려나. 한참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여동생 생각을 했다. 이, 십대의 끝물에 읽고 한숨쉬며 내가 이거 다시 읽으면 사람도 아니라고 중얼거렸던 그 책을 다시 읽다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