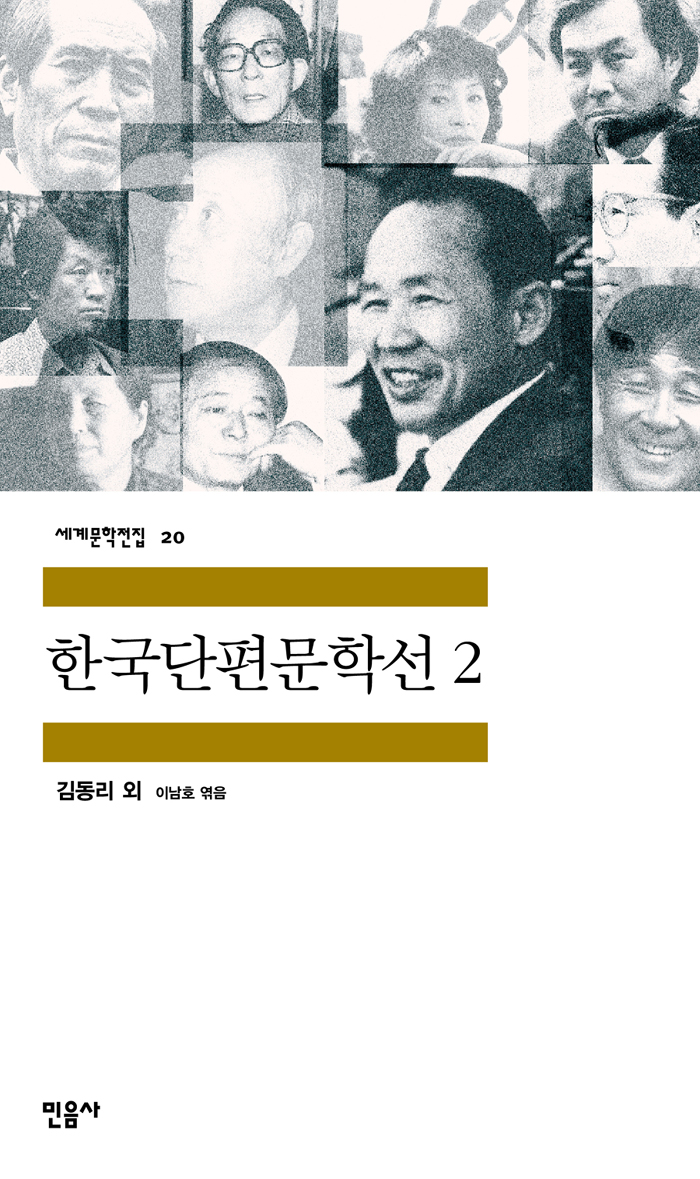한국 단편문학선 1에서는, 그래도 읽은 이야기들이 꽤 있네 하며 느긋하게 읽었지만, 단편문학선 2는 꽤 치열하게 읽어야 했다.
물론 김동리며 황순원, 오영수, 손창섭, 정한숙……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수능 본 사람이 이름 못 들어보았을 리 없는 쟁쟁한 분들이지만, 아예 일제시대, 1930년대 소설과 달리 해방 이후로 오면, 또 단편집으로 살뜰히 하나하나 찾아 읽기도 쉽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미 읽은 소설도 있었다 해도 단편문학선 2는 신선했다. 소나기는 읽었으되 비바리는 읽지 못했고, 손창섭 하면 잉여인간을 먼저 생각했지 혈서는 처음 읽었으며, 이호철, 장용학, 서기원의 소설은 처음 읽었다.
물론 하이틴 로맨스 내지는 피 안 섞인 남매물의 원조라는 느낌이 들어 대체 왜 이 소설이 수능에 단골 출제되는가…… 라는 내 나름의 고뇌를 하게 하는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가 잠시 나를 고뇌케 하였으나. (그렇다, 로맨스를 싫어하는 나는 이 소설에도 손발이 오그라들어 고뇌하였다 이거다.)
선우 휘의 강렬하고 힘 있는 글, 정한숙의 전황당 인보기가 담은, 흘러가는 세월과 자본과 권력을 우선으로 아는 세태 속에서 전통의 가치를 지켜가는 이의 쓸쓸한 빛깔, 황토기와 까치 소리에서 느껴지는, 토속적이면서도 끈질긴 어떤 힘. 이 책은, 내게 있어 마치 서울대 추천도서 목록을 보는 듯, 새로운 독서를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일단, 토지와 김약국의 딸들로만 기억하는 박경리님의 단편들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만으로도 이 책은 내게 제 가치를 다 했을 거다. 어차피 이 전집 또한 넓게 보면 그러하지만, 한 권 혹은 한 덩어리 안에 문학을 골라 넣는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지닌 작품이라는 뜻인 동시에 에디터의 시각 범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 한 덩어리를 읽는 것은, 새로운 독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나이 서른 살, 결혼을 준비하고 막 신혼을 맞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무리해서 100권의 고전을 읽는 것이, 상황이 상황이라 더욱 감수성이 예민해진 이 시기, 알몸으로 폭우를 맞는 듯한 이 문학적 샤워가, 내게는 새로운 독서와 글을 위한 한 통과 의례가 되는 것 처럼.